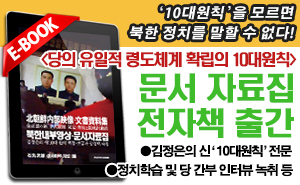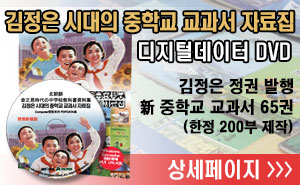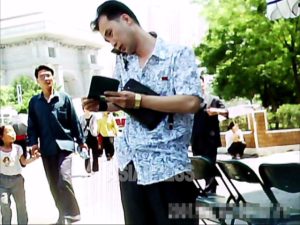◆ 국가가 식량을 공급, 법률에 명시
이를 위해 2021년에 개정된 양정법을 살펴보자.
'양정법 제4조에서는 '국가는 량곡수매를 유일적으로 하며 국가적인 량곡수요와 농장원들의 리익을 다같이 고려하는 원칙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량곡수매를 진행하고 량곡수매 정형을 엄격히 총화대책 하도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7조는 '량곡을 책임지고 공급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시책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통치의 수단으로 량곡을 관리하며, 그 유통을 철저히 국가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의지를 법률에서 강조한 것이라고 추측된다.
◆ 계약에 의한 식량 조달
그렇다면 바뀐 것은 무엇일까?
큰 틀에서 보면 과거 국가의 ‘전량수매, 전량배급’ 정책으로부터 일부수매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수매는 북한의 식량 유통과 관련된 중요한 제도로, 정부가 국가계획에 따라 농민(농장)으로부터 식량을 국정가격(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제도이다. 수매제도는 사실상 배급제도의 근간이다.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농업법과 양정법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2020년 9월에 개정된 농업법 제60조부터 살펴보자.
'농업생산물의 공급은 계획과 계약에 따라 한다.'
여기서 계획은 국가에 의해 집행되는 의무수매를 말하는 것이고, 계약은 농장이 공장이나 기업소를 대상으로 맺은 계약에 의한 수매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2021년 3월에 개정된 양정법의 11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량곡수매는 국가투자몫에 의한 의무수매와 계약에 의한 수매로 나누어 농업지도기관소속 량곡 수매검사기관이 한다'.
이번 농정 개편으로 국가는 군이나 경찰, 공무원 등 국가의 필수 운용 인력에 대한 식량만 계획의 방식으로 수매하고, 그 이외는 각 농장이 기업과 계약하는 방식으로 조달하는 방침인 것으로 추측된다.
언뜻 이것은 식량에 대한 국가의 유일적 관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김정은 정권이 그리는 식량 유통 체계의 보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서 이어가도록 한다. (계속 >>)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북한특집>김정은이 시도하는 농정 개편의 실체는 무엇인가 (9) 농민은 '량곡판매소'에만 판매 허용 식량 유통의 국가 독점은 안착되고 있는가?
<북한특집>김정은이 시도하는 농정 개편의 실체는 무엇인가 (8) 농장이 직접 양곡 판매, 가격 제정까지... 새로 등장한 ‘영농물자교류소’는 무엇인가?
<북한특집>김정은이 시도하는 농정 개편의 실체는 무엇인가 (7) 농장 식량 유통의 새로운 틀을 짜다
<북한특집>김정은이 시도하는 농정 개편의 실체는 무엇인가 (6) 불법 경작지 - ‘소토지’ 완전 금지 정책에 농민들은 위기감
<북한특집>김정은이 시도하는 농정 개편의 실체는 무엇인가 (5) 분배 방식 바꿨는데… “계획량은 높고 분배량은 적어” “맥이 풀린다” 농장원들의 하소연
<북한특집>김정은이 시도하는 농정 개편의 실체는 무엇인가 (4) 국가계획 VS 농장원의 생존, 어떻게 나눌 것인가? 분배의 변화
<북한특집>김정은이 시도하는 농정 개편의 실체는 무엇인가 (3) 확장되는 농장의 경영권 “이제 농장이 지주 역할 한다”는 농민도
<북한특집>김정은이 시도하는 농정 개편의 실체는 무엇인가 (2) 농장의 기업화, 법률에 명시 '주체농법'은 폐기됐나?
<북한특집>김정은이 시도하는 농정 개편의 실체는 무엇인가 (1) 농장에서 '협동'이 사라졌다 농업 관련 법규 대폭 손질
- <북한내부>협동농장의 국영화 단행한 듯 명칭 변경을 현지에서 확인 농지 소유의 대전환 가능성 "농민들은 관심 없다" 이유는?
- <북한내부>올해의 '퇴비전투' = 인분 쟁탈전 치열 할당량 초과에 이례적 포상 금품, 관광까지 "변소 밑에서 삽 들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
- <북한내부>탈북 '최후의 거점'이 위기 단속 성과로 비밀경찰 표창 밀수와 탈북은 거의 근절
- <북한내부>'굶주리는 봄' 다가오며 불안 확산 김정은 정권은 '절량세대' 조사 개시 "인구의 45.5%, 1180만 명이 영양실조" 유엔 기관 보고
- <북한내부>가난한 여대생 4명 매춘 행위로 퇴학, 농촌에 추방 청년의 질서 위반 철저히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