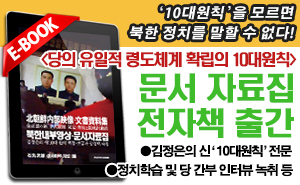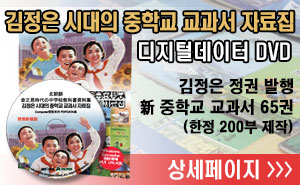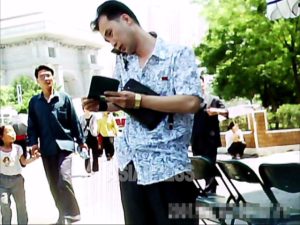유통은 북한의 현 농업 정책 개편에서 가장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는 분야다. 법률적 측면에서 많은 개편이 포착되는 한편, 아시아프레스 북한 내 취재협력자들의 보고를 통해서도 양곡 유통의 새로운 정책이 정착해가는 중인 것이 확인된다. (전성준 / 강지원)
<북한특집>김정은이 시도하는 농정 개편의 실체는 무엇인가 (1) 농장에서 '협동'이 사라졌다 농업 관련 법규 대폭 손질
◆ ‘고난의 행군’과 배급제도의 붕괴
과거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기반으로 국가가 주민의 식량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배급제도를 운영해왔다. 배급제도에서 식량 유통은 한마디로, 농촌에서 생산된 식량을 국가가 국정가격으로 사들여 주민에게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90년대 계획경제체제가 붕괴되고 농촌에서는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는 한편, 국가의 식량 유통 통제력에 빈틈이 생기면서 과거의 식량 공급체계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워졌다.
국가는 수중에 확보한 제한적인 식량으로 당과 군, 평양시 중심부의 시민을 비롯해 체제 유지에 필수적인 계층에 우선적으로 식량을 공급했고, 나머지 주민은 방치해 버렸다. 이는 북한 역사상 최악의 대기근을 불러왔다.
◆과거는 배급과 시장의 공존, 현재는?
이 시기 자연발생한 시장은 계획경제의 폐허에 스며들어 굶주린 주민에게 식량과 물자를 공급하고 암울한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파탄된 국가 공급체계를 대신하는 시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었던 당국의 묵인 아래, 시장은 배급제도와 더불어 주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자리잡았다. 그 기간 동안, 식량 유통의 영향력을 두고 국가와 시장 사이에 줄다리기가 지속되어왔다.
하지만, 농정 개편으로 인해 시장의 역할은 대폭 줄어들고 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시장에 내어주었던 영향력을 탈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설계한 식량 유통의 틀을 정착시키는 중이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구조와 현지 도입 상황에 대해 법률과 현지 협력자의 보고를 통해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