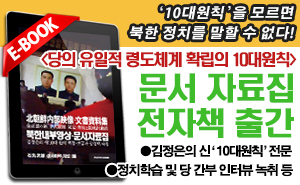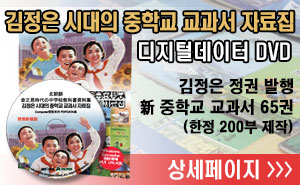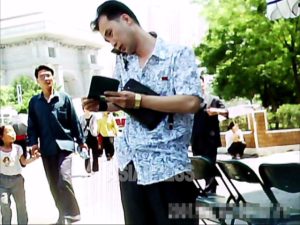◆ 도입된 정책의 철회 사례도
정책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쳐 정책이 철회되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2024년 9월, A 씨가 이에 대해 전해왔다.
“무역회사나 공장, 기업소들이 영농자재를 대주고 그 대신 식량으로 받고 농장은 그것으로 국가계획을 대신하고 했는데 올해는 차단시켰다고 해요”
앞선 기사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김정은 정권에서는 최근 몇 년간 ‘계약수매’라는 새로운 양곡 유통 방식을 공식 도입했다. 개정된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었다. 이는 무역회사나 기업소가 수매계약에 의해 농장에 비료, 농기구, 농약 등 영농자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확물의 일부를 직접 받는 방식이었지만, 작년 말 북한 당국은 그러한 수매 방식을 중단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A 씨는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올해 수해도 많이 입고 농장에서 생산량도 떨어지고 해서 국가에 들어가야 할 식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국가 몫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기업간 거래에 대한 처리도 진행하게 한다는 방침이라고 해요”
많은 언론이 보도한 바와 같이, 2024년 평안북도와 자강도 일대에서 심각한 수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있었다. 식량 생산이 감소한 상황에서 당국은 군대와 평양주민, 주요 산업 노동자 등 우선배급 대상에게 지급할 ‘국가 몫’을 먼저 확보하려고 계약수매 방식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일시적인 조치인지는 확실치 않다.
식량 부족이라는 현실적 난관과 체제 유지를 위한 통제 강화 사이에서 북한 당국의 새로운 농업 정책의 도입은 현장에서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결국 이 혼란의 부담은 농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시리즈의 마지막이 될 다음 기사에서는 새로운 정책이 농민들의 삶에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농민의 생각에 대해 살펴본다. (계속>>)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북한특집>김정은이 시도하는 농정 개편의 실체는 무엇인가 (10) '농포'는 옛말, '농장원 인기 많다'는 주장도 새 정책에 기대감 있지만...
<북한특집>김정은이 시도하는 농정 개편의 실체는 무엇인가 (8) 농장이 직접 양곡 판매, 가격 제정까지... 새로 등장한 ‘영농물자교류소’는 무엇인가?
<북한특집>김정은이 시도하는 농정 개편의 실체는 무엇인가 (7) 농장 식량 유통의 새로운 틀을 짜다
<북한특집>김정은이 시도하는 농정 개편의 실체는 무엇인가 (6) 불법 경작지 - ‘소토지’ 완전 금지 정책에 농민들은 위기감
<북한특집>김정은이 시도하는 농정 개편의 실체는 무엇인가 (5) 분배 방식 바꿨는데… “계획량은 높고 분배량은 적어” “맥이 풀린다” 농장원들의 하소연
<북한특집>김정은이 시도하는 농정 개편의 실체는 무엇인가 (4) 국가계획 VS 농장원의 생존, 어떻게 나눌 것인가? 분배의 변화
<북한특집>김정은이 시도하는 농정 개편의 실체는 무엇인가 (3) 확장되는 농장의 경영권 “이제 농장이 지주 역할 한다”는 농민도
<북한특집>김정은이 시도하는 농정 개편의 실체는 무엇인가 (2) 농장의 기업화, 법률에 명시 '주체농법'은 폐기됐나?
<북한특집>김정은이 시도하는 농정 개편의 실체는 무엇인가 (1) 농장에서 '협동'이 사라졌다 농업 관련 법규 대폭 손질
- <북한내부>'전화기의 안을 보여라’ 너무 엄격한 단속에 반항한 학생 커플이었지만
- <북한내부>위조지폐 대량 나돌아 북한 원, 중국 위안, 금권 '돈표'까지... 대대적 단속에도 계속 확산
- <북한내부>가정주부까지 선발... 농촌동원 '여맹돌격대' 신설 한편 김정은 정권은 농장에 동원자 인건비 부담 요구
- <북한내부>가난한 여대생 4명 매춘 행위로 퇴학, 농촌에 추방 청년의 질서 위반 철저히 처벌
- <북한내부>'굶주리는 봄' 다가오며 불안 확산 김정은 정권은 '절량세대' 조사 개시 "인구의 45.5%, 1180만 명이 영양실조" 유엔 기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