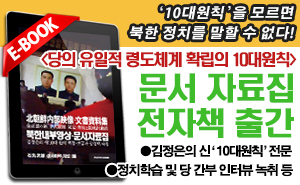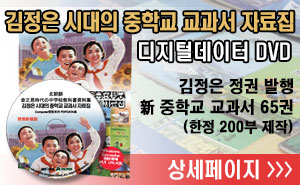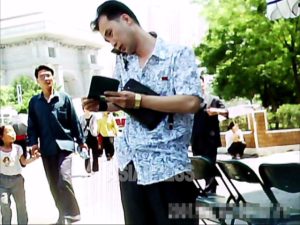◆ 웃음소리, 냄새... 처음 실감한 '사람 사는 나라'
북한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 2024년 10월 중순 아시아프레스 기자 두 명이 북중국경지대로 향했다. 압록강 최하류인 단동(丹東)에서 거슬러 올라가, 두만강 최하류인 방천(防川)에 이르는 1400km 중에, 국경 접근이 가능한 약 1000km를 10일에 걸쳐 여행했다. 취재자 전성준은 탈북자이며, 홍마리는 조부의 고향이 북한에 있는 재일 4세다. 조선반도에 뿌리를 둔 두 사람이, 국경에서 보고 느낀 것을 통해 이웃 나라인 북한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다.

◆ 두 가지의 조선 뿌리
2022년, 회사를 그만뒀다. 뿌리를 마주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렇다 할 것은 없다. 그저, 단지 알고 싶었을 뿐이다. 조부모가 어떤 곳에서 태어나 자랐는지, 왜 고향을 떠났는지. 재일(在日)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족의 역사를 알지 못했다. 그 반동으로 생긴 호기심이, 할머니가 태어난 한국으로의 어학연수로 나를 이끌었다.
하지만, 또 다른 뿌리의 땅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자란 함경남도다. 생전에 할아버지로부터 고향의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미나마타병으로도 알려진 질소화학공장에서 일한 것. 1945년 8월에 진주해 온 소련군을 피해 남하한 서울에서 할머니를 만난 것.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이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땅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국경지대는 늘 가보고 싶은 장소였다.

◆ 첫 대화에서 '적국'이라 불리다
처음으로 북한 사람과 말을 나눈 것은 요녕성 심양시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였다. 입구에서 여성 종업원이 중국어로 말을 걸어왔다. 무심코 "한국어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라고 말하자, "한국어가 아니라 조선어입니다!"라며 노려보았다. 뒷걸음질을 칠 정도로 무서운 태도였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돌아가세요"
"왜 그러시죠?"
"일본은 영원한 적국이니까"
결국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맨 구석 자리에 차도 내주지 않는 푸대접이었다. 하지만 식사를 하면서 태도는 누그러졌고, 웃는 얼굴로 냉면을 비벼주기까지 했다.
"왜 한국인은 입장할 수 없는 건가요?"라고 물어보았다. "괴뢰(한국) 놈들은 적국이니까요" 단숨에 토해내는 말투가 몹시 기계적인 인상을 주었다. 2023년 말, 김정은은 "대한민국은 적"이라고 선언했다. 그 방침은 중국에 파견된 노동자에게도 철저히 적용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