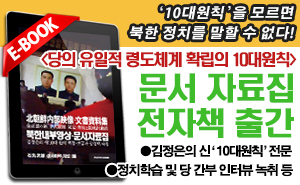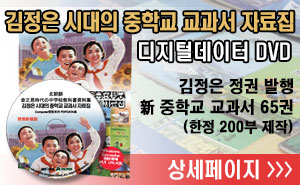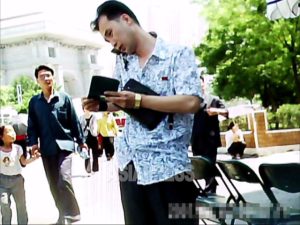(참고사진) 평양시 중심부 모란봉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남성. 옷차림이나 사용하는 물건들로 보아 돈주가 아닐까? 2011년 6월 구광호 촬영 (아시아프레스)
신흥 부유층 ‘돈주’, 김정은 시대의 흥망성쇠 (1) 시장을 무대로 등장한 돈주, 대몰락의 서막
코로나19 팬데믹을 기화로 북한은 과거 시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국가 주도로 전면 재편했다. 이 과정에서 기반을 잃어버린 돈주는 대거 몰락했다. 하지만 최근 국가 유통망에서 개입해 이익을 얻는 새로운 돈주 세력이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들은 누구이며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전성준 / 강지원)
◆ 유통 시스템의 대전환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는 계획 경제가 붕괴하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의존하는 민간 유통망이 발달했고, 이 과정에서 돈주들이 유통업을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김정은 정권은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실상 시장이 주도하는 유통망을 국가 수중에 장악하고 싶었지만,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감한 분야라 쉽게 시도하기 어려웠고, 결국 시장과의 공존을 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이 봉쇄되고 지역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기존 시장 중심의 유통망이 큰 타격을 받았고, 이는 무역, 운송, 도매 등 주로 유통업을 영위하던 돈주들을 질식 직전의 사태에 이르게 했다.
김정은 정권은 이 시기 돈주 때리기 정책과 아울러 국영상점의 ‘국가유일가격제(정찰제)’를 실행하고 철도 수송 관리를 강화하며, 철도 역 가까이에 물자보관창고를 건설하는 등 국가 유통망 확립을 위한 작업을 병행했다.
현시점에서 국가의 독점 유통망은 상당한 정도로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함경북도에 거주하는 아시아프레스 협력자 A 씨는 지난 6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올해 들어서 시, 도 상업관리소가 철도를 이용해서 수산물, 공업품 등 타지역 물자들을 수송해서 국영상점을 통해 유통하고 있는데, 이전에 차판장사들이 하던 걸 이제는 국가가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국가 독점 유통과 그 작동 방식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국가 독점 유통이란 무엇인가?
국가 독점 유통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의 시장 중심 유통 시스템과 비교해 보자.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수입 → 생산:
과거 중국으로부터 대량 수입되던 물품을 가능한 국산품으로 대체하였다. 이를 북한 당국이 ‘국가유일무역’ 라고 부르는 강력한 무역 정책을 펼쳤다.
도매상 → 상업관리소:
각 지역으로의 물품 분할과 도매를 담당하던 돈주의 역할을 국가 소속 상업관리소가 전면 대행하게 되었다.
운송업자 → 국가주도 운송방식
차판장사라 불리는 개인 운송업자의 물류사업을, 철도 중심의 국가 주도 운송방식으로 대체하였다.
장마당 → 국영상점:
과거 장마당 중심의 판매구조에서 국영상점을 주축으로 하고, 장마당을 보조적 역할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현 유통 체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전체를 총괄하는 국가의 역할이다. 국가기관인 상업관리소(상업국)는 유통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며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〇 생산품 인수 :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과 일부 수입물품을 체계적으로 확보
〇 지역별 배정 :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지역별 물품 할당
〇 운송 연결 : 철도를 중심으로 국가 물류망을 통한 운송 조정
〇 물자 관리 : 유통 과정에서의 물자 손실 방지 및 품질 관리
〇 판매 감독 : 국영상점을 통한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판매 과정 총괄
※ 상업관리소는 각 시, 군 인민위원회(정부) 소속으로 지역 유통을 조직, 통제, 관리하는 실무 기관이다.
보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실제로도 잘 작동할까? 협력자들은 국가 주도 유통 구조가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 “국가에 돈이 없다”
큰 문제는 운송, 즉 차량과 연료라고 A 씨는 말한다.
“함흥, 청진, 대도시에서는 이전 장마당 못지 않게 (국영상점에)상품도 많아지고 도매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철도 역 가까운 곳이고 그 외 먼 곳에서는 운수 수단 때문에 상품 조달이 많지 않다”
A 씨는 국가에 새로운 유통 체계를 운영할 돈이 없다며, 돈주가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한다.
“말은 좋지만 (국가에)돈이 없어 상업관리소 명칭으로 돈주들이 다 하고 있어요. 개인이 구매한 차량을 상업관리소에 등록하고 물자 운반과 도소매품 배달까지 맡아서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A 씨는 “공장에서 생산한 상품을 상업관리소에서 취합해서 국영상점에 공급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운송수단이 없으니 개인이 국가 기관에 소속돼 로임도 받고 돈벌이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주변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번에 OO시 상업관리소가 청진에서 들여온 수산물을 국영상점에서 싼 값에 판매했는데, 실제로는 (상업관리소에) 돈이 없어서 상업관리소 명칭으로 개인이 돈을 대서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말이 상업관리소지 돈주가 돈벌이 하는 거지”
◆ 부상하는 돈주
양강도의 협력자들도 진화된 돈주의 행태를 보고했다. 지난 6월 말, 양강도의 협력자 B 씨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돈주들이 과거에는 (상품을) 장마당을 통해 풀었다면, 지금은 상업관리소 명목으로 수산물이나 농촌에서 물자들을 받아서 국영상점에서 도매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양강도의 협력자 C 씨는 한 발 더 나아가 돈주들이 국영 유통망에 아예 소속돼 돈벌이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 거래를 단속하기 때문에 돈주들이 상업관리소 직원이 돼서 단속을 피한다. 국영상점도 돈주들이 책임자로 있으면서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을 판매원으로 앉혀놓고 돈벌이를 한다. (수입품을 판매하는)외화상점, 위탁수매상점들도 모두 돈주들이 운영한다고 보면 된다”
국가 유통기관의 명칭을 빌리거나 지어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돈벌이를 하는 돈주. 이들이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국가사업에 투자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윤을 분배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과거와는 확실히 다르게, 즉 체제에 주동적으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국가권력과의 관계 맺음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 기사에서는 현재 북한에서 기업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 중인 것으로 보이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의 연관 속에서 돈주의 역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계속 4>>)
※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신흥 부유층 ‘돈주’, 김정은 시대의 흥망성쇠 (1)시장을 무대로 등장한 돈주, 대몰락의 서막
신흥 부유층 ‘돈주’, 김정은 시대의 흥망성쇠 (2)코로나와 반시장 정책… 거듭된 악재에 “70~80% 돈주는 몰락했을 것”
신흥 부유층 ‘돈주’, 김정은 시대의 흥망성쇠 (4)‘기업책임관리제’의 정착, 바야흐로 기업의 시대… 틈새 노리는 돈주
신흥 부유층 ‘돈주’, 김정은 시대의 흥망성쇠 (5)경제개편정책 아래 새롭게 부상, 기업에 진입해 대박을 터뜨리는 돈주, 그들은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