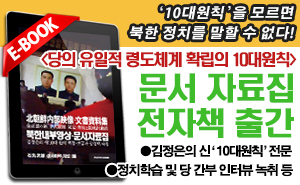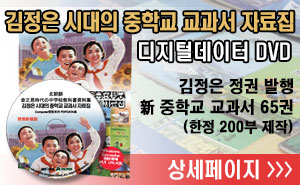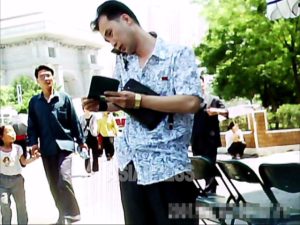◆30대 후반부터 생긴 이변
영숙 씨의 양친은 제재소와 맹장지제작소를 재개했고, 영숙 씨는 연극과 음악에 몰두한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점점, 가족은 북한 귀국사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간다. 1960년, 다섯째 오빠와 장녀, 영숙 씨를 제외한 6형제와 양친이 귀국. 명달 씨는 조선인 여성과 결혼해 함께 귀국했다. 귀국할 의사는 전혀 없었던 영숙 씨도 북한에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바꿔 2년 후 귀국했다.
영숙 씨는 중국과의 국경에 위치한 평안북도 신의주에 배치됐다. 명달 씨도 같은 신의주시에 살게 됐고, 락원기계연합기업소에 근무했다. 하지만, 30대 후반부터 이변이 생겼다고 한다.
윤미 씨는 삼촌의 모습을 이렇게 말했다. "무척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해져서 마치 뇌졸중 후유증 같았습니다"
◆히로시마 제1중학 동급생에게서의 뜻밖의 연락
1990년대 초반으로 윤미 씨는 기억한다. 히로시마 제1중학의 동급생으로부터, 명달 씨에게 편지가 왔다.
원폭 투하 후 시내에서 함께 구출활동을 한 명달 씨가, 북한에 가고 나서는 치료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동창회에서 화제가 되어 명달 씨를 위한 지원 활동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 무렵, 명달 삼촌은 도움 없이 생활하기엔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대필해서 (편지를)주고받은 것을 기억합니다"라고 윤미 씨는 말한다.
동급생들은 제3국에 사는 원폭피해자의 구제활동을 하는 단체에 연락해 지원을 의뢰했다. 하지만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자, 동급생들의 돈을 모아 송금하게 됐다. 93년 경 200만 엔 가까운 거액이 도착했다. 윤미 씨는 경위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포토저널리스트인 이토 타카시(伊藤孝司) 씨에 따르면, 1990년대 북한 정부는 국내 피폭자의 실태를 조사했다. 95년에는 피폭자협회가 설립돼 독자적으로 피폭자 수첩을 발행했다. 그 이유는 히로시마에서 피폭한 리실근 씨가 일본에서 '재일본 조선인 피폭자 연락협의회'를 설립해 북한 당국이 움직이도록 활동했기 때문이다. 북한 주재 피폭자는 거의 전원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귀국사업으로 건너간 재일조선인이었다.
영숙 씨도 윤미 씨도, "(명달 씨가)정부의 조사 대상이 된 기억은 없다"라고 말한다. 히로시마 제1중학 동급생들은, 이실근 씨 등의 운동에 촉발돼 명달 씨를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명달 씨는 송금을 받은 몇 년 후 북한에서 사망했다. 일본에서 피폭해 북한에 건너간 후에도 후유증으로 고통받은 재일조선인이 존재한 것, 그리고 조선인 학우를 잊지 않고 지원의 손을 내민 히로시마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원폭 투하 80년이 지난 지금 기억하고자 한다.
- 북한에 귀국한 9만 3천 명의 재일조선인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 <북한내부>'핵실험 실패로 히로시마처럼 된다' 떠도는 소문에 당국은 긴장 (사진 3장)
- <특집> 북한 탈출... 그 발생과 현상 (2) 체제의 위협이 된 탈북자... 일본에도 200명 이시마루 지로
- 웃는 얼굴로 북한에 건너 간 사진 속 소년소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재일' 귀국사업으로부터 60년
- ‘일본 안의 북한’을 그리는 재일영화감독 양영희 씨… 인생을 걸고 영화를 찍는 ‘월경인(越境人)’ 이시마루 지로
- 북한으로 돌아간 在日朝鮮人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가(1) 희박해지는 귀국자에 대한 기억과 생각 이시마루 지로